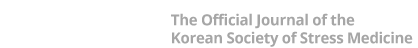Articles
- Page Path
- HOME > STRESS > Volume 28(4); 2020 > Article
-
Original Article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
송유리
 , 박영숙
, 박영숙
-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are Competence on Spiritual Nursing by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
Yuri Song
 , Young Suk Park
, Young Suk Park
-
stress 2020;28(4):246-253.
DOI: https://doi.org/10.17547/kjsr.2020.28.4.246
Published online: December 31, 202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Korea
• Received: November 17, 2020 • Revised: December 7, 2020 • Accepted: December 7, 2020
Copyright © 2020 by stress.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2,365 Views
- 138 Download
- 1 Crossref
Key messages
-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 214명의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온라인 연구 플랫폼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42.6%가 영적 간호를 수행하지 못했을 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46.4%가 영적 간호 수행의 방해요인으로 업무 환경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의사소통의 영적 돌봄 역량(β=0.36, p<.001),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β=0.21, p=.001), 종교 중요도(β=0.18, p=.013), 실존적 안녕(β=0.18, p=.010), 영적 간호 지식 습득(β=0.14, p=.033)이었으며, 총 설명력은 41.1%이었다. 이들 요인에 초점을 둔 영적 간호 수행 증진 통합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
Abstract
-
Background
- This is a cross-sectional survey to explore the effect of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care competence on performing of spiritual nursing by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214 nurses with experience of caring for cancer patients for more than one year. The data were collected by an online survey using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spiritual care competence scale, and spiritual nursing scale.
-
Results
-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forming of spiritual nursing were communication (β=0.36, p<.001), satisfaction from spiritual nursing (β=0.21, p=.001), importance of religion (β=0.18, p=.013), existential well-being (β=0.18, p=.010), and knowledge acquisition of spiritual nursing (β=0.14, p=.033). The explanatory power of these variables on performing of spiritual nursing was 41.1%. When spiritual nursing was not carried out, 42.6% of nurses felt sorry and pitiful towards the patient; and 46.4% pointed out the difficulties in working environment that posed an obstacle.
-
Conclusions
- We should develop an integrated program on spiritual nursing improvement, focusing on these key factors, to enhance the performance of spiritual nursing for cancer patients and to verify its effectiveness.
- 현대의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망자 285,534명 중 27.6%가 암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9).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국가적, 개인적 차원의 건강 검진이 보편화되면서 암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가능해지고 예후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암은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의 영적 요구는 건강한 상태보다는 질병 상태에서, 특히 암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 증가한다(Yoon, 2009). 암으로 인한 죽음, 두려움, 고통 등의 부정적인 상황은 이전보다 자신의 실존적 존재와 영적 차원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며(Jo et al., 2019), 영적 안녕이 환자의 건강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영적 간호가 암환자의 치유 촉진(Fish et al., 1978), 통증과 불안의 유의한 감소(Yoon, 2009), 영적 고통의 감소와 극복, 영적 요구 충족과 영적 안녕 상태의 증진(Kim et al., 2004), 정신적, 지지적, 영적 차원의 효과(Yoo, 2013) 등에서 긍정적인 실증적 근거들이 제시되어 왔다. 또한 암 환자의 종교와 영성은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과 높은 상관성을 가지며, 정신건강의 가장 강력한 예측 인자로 제시되기도 한다(Garssen et al., 2016). 더불어 암환자에게 영적 중재 효과를 검증한 여러 연구들에서 영적 중재가 환자들의 영적 안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이 확인되고 있어(Pantuso, 2015; Garssen et al., 2016; Joo et al., 2020)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영적 간호는 환자의 영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특정 상황에서 영적 간호의 지식과 기술, 태도를 갖추어 영적 안녕을 충족시키는 간호 활동을 말한다(Kang, 2006). 즉 영적 간호의 수행은 환자의 내재된 영적 요구를 발견하고 영적인 고통을 최대한 감소시키며, 영적 안녕 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Fish et al., 1978). 간호사는 환자의 영적 관심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이며, 간호사의 영적 측면에 대한 인식이나 안녕 상태는 환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Fisher et al., 2008). 그러나 간호사의 영적 간호는 간호 실무에서 시간 낭비로 치부되거나 종종 기피되고 무시되는 경향이 있으며(Lee, 2000),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은 중간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Lim, 2009) 혹은 중간 정도(Shin et al., 2004) 상태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Choi (2014)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간호사의 영적 요구 인식과 영적 안녕이 보통 정도이며, 특히 영적 간호 수행은 낮은 수준이므로 영적 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저해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 이처럼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부족, 영적 간호 수행의 어려움과 저해요인 규명, 영적간호프로그램 개발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음에도(Ross, 1994; Highfield, 2000; Lim, 2009; Choi, 2014; Lee et al., 2016; Sim et al., 2017), 국내 간호 실무나 연구에서의 진전된 변화는 미미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반면 최근 국외에서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적 간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보고하는 임상실험연구들(Hu et al., 2019b; Mehdipoorkorani et al., 2019)은 고무적이다.
- 간호사들은 영적 간호가 전인 간호의 한 요소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간호사의 영성과 실무에서의 영적 간호를 이해하는데 혼돈이 있으며 이에 대한 통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Cooper et al., 2020). 또한 종종 간호사의 역량 부족으로 암 환자의 영적 간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이들의 영적 간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영적 간호 훈련이 요구된다(Hu et al., 2019a). 간호 실무의 영적 간호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이 필수적으로 같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영적 간호 연구는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 수행(Lim, 2009; Choi, 2014) 혹은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 역량(Sim et al., 2017)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영적 간호 역량과 영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Chung et al., 2011; Kim et al., 2015). 또한 영적 간호 수행에 초점을 두고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의 세가지 핵심 개념의 특성과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고, 나아가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 역량의 세부적인 내용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과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간호 실무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과 영적 간호 수행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의 각 하부 요인들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영적 간호 수행 증진 통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서 론
- 1. 연구설계
- 본 연구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 본 연구대상자는 1년 이상 암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 중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간호사이다. 연구대상자의 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05, 효과 크기 .15, 검정력 95%, 예측변수 9개를 기준으로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최소 표본 수로 167명이 요구되었으며, 탈락 가능성을 예상하여 229부를 수집하였다. 이 중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한 15부를 제외한 총 214부(93.4%)가 분석되었다.
- 3. 연구도구
- Paloutzion 등(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 척도(Spiritual Well-Being Scale)를 Choi (2014)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로 측정하였으며, 도구 사용에 대해 원저자의 승인을 받았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20∼10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의 각 10문항의 총 20문항으로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93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6이었으며,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는 종교적 안녕 .99, 실존적 안녕 .93이었다.
- van Leeuwen 등(2009)이 개발한 영적 돌봄 역량 척도(Spiritual Care Competence Scale)를 제 1저자인 van Leeuwen 에게 도구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연구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하였고, 영어 전공자의 역 번역 과정을 거쳐 수정하였다. 이후 암 병동 수간호사 5인, 암 환자를 돌본 경험이 20년 이상인 간호사 5인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한 후 사용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관련성을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한 후 산출한 각 문항의 평균 내용 타당도 지수는 .97이었다. 본 도구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27∼13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돌봄 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27문항으로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72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7이었고,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는 영적 돌봄 사정과 수행(6문항) .96, 영적 돌봄의 질 향상과 전문화(6문항) .96, 환자의 상담과 개인적 지지(6문항) .94, 전문가 의뢰(3문항) .92,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4문항) .89, 의사소통(2문항) .89이었다.
- 영적 간호의 수행은 Fish 등(1983)이 개발한 영적 간호 척도(Spiritual Nursing Scale)를 Choi (2014)가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를 사용 허락을 받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혀 못한다’ 1점에서 ‘항상 한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 범위는 20∼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간호 수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총 20문항으로 도구개발 당시 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하부 요인의 Cronbach’s α는 사랑과 관심(7문항) .88, 의미와 목적(11문항) .89, 용서(2문항) .70이었다.
- 4. 자료수집
- 자료수집은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IRB No. ABN01-202002-22-07). 설문 조사는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구자의 연구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암 환자를 1년 이상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의 연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암 전문병원과 암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모집 공고에 대해 안내하였다. 설명문과 동의서가 포함된 설문지는 연구 플랫폼(https://redcenter.modoo.at/)에 게시하였고, 자발적으로 설문지 링크에 접속하여 연구목적, 익명성 및 비밀 보장 등이 명시된 온라인 서면 동의서에 동의한 경우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작성 소요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 5. 자료분석
-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적 및 영적 관련 특성, 영적 돌봄 역량과 영적 간호 수행의 정도는 기술 통계를 이용하였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다중선형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1) 영적 안녕
2) 영적 돌봄 역량
3) 영적 간호 수행
- 1. 인구사회적 특성
- 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4.24세로 30세 이하 52.8%, 미혼 62.6%, 학사 79.0%이었다. 종교는 52.3%가 없었고, 근무 기간은 평균 8.22년으로 5년 이하가 54.7%, 일반간호사가 78.1%이었다. 환자의 임종 경험은 86.9%가 있었으나 환자 외 임종 경험은 72.0%가 없었으며,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55.6%, 급여 만족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Table 1).
- 2. 영적 관련 특성
- 자신의 생활에서 종교에 대한 중요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대상자는 41.6%이었다. 영적 간호 훈련은 70.6%,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교육은 41.6%가 받은 경험이 없었다. 가장 어려운 간호 수행 유형을 영적 간호로 응답한 대상자는 72.4%, 자신의 영적 간호 수행에 대해 불만족이 61.2%로 가장 많았다. 영적 간호 수행의 어려운 점은 전문지식, 기술, 의사소통 등 전문성 부족 66.8%, 시간 부족 33.2% 순으로 나타났다. 영적 간호를 수행하지 못할 때 느낌은 다중반응빈도분석 결과, 환자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 42.6%, 자책감, 무력감, 죄책감과 우울감 31.8%, 자신의 한계로 인한 답답함과 불편감 25.6%이었다. 영적 간호 수행 방해 요인의 다중반응빈도분석 결과, 업무환경 어려움 46.4%, 교육과 훈련 부족 31.1% 순으로 많았다(Table 2).
- 영적 안녕의 문항 평균은 5점 척도의 2.98 (±0.76)점으로 하부 요인에서 실존적 안녕(3.28±0.65)이 종교적 안녕(2.69±1.07) 보다 높았다. 영적 돌봄 역량의 문항 평균은 5점 척도의 2.99 (±0.69)점으로 하부 요인에서 의사소통(3.87±0.81),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3.69±0.83) 순으로 높았고, 영적 간호의 질 향상과 전문화(2.65±0.82)가 가장 낮았다. 영적 간호 수행의 문항 평균은 4점 척도의 2.33 (±0.46)점으로 하부 요인에서 사랑과 관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2.78±0.51)이 가장 높았고, 용서받고 싶은 요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2.38±0.60), 의미와 목적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2.05±0.51) 순이었다(Table 2).
- 3.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과 영적 간호 수행 간의 상관관계
- 영적 안녕은 영적 돌봄 역량과 양의 상관관계(r=.54, p< .001)로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영적 돌봄 역량이 높았다. 영적 안녕은 영적 간호 수행과 양의 상관관계(r=.44, p< .001)로 영적 안녕이 높을수록 영적 간호 수행이 높았다. 영적 돌봄 역량은 영적 간호 수행과 양의 상관관계(r=.48, p<.001)로 영적 돌봄 역량이 높을수록 영적 간호 수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4. 영적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인구사회적 특성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연령, 학력, 종교, 환자 외 임종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 급여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종교와 환자 외 임종 경험은 가변수(dummy variable)로 처리하여 종교 유무, 환자 외 임종 경험 유무에 따라 없을 때를 0, 있을 때를 1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1로 잔차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공차한계는 0.74∼0.97로 0.1 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04∼1.35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F=5.25, p<.001),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종교 유무(β=0.14, p=.031)와 주관적 건강상태(β= 0.18, p=.016)이었고, 설명력은 10.7%이었다.
- 영적 관련 특성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종교에 대한 중요도, 영적 간호 훈련,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교육, 가장 어려운 간호 수행 유형, 자신의 영적 간호 수행에 대한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영적 간호 훈련과 영적간호에 대한 지식 교육은 가변수로 처리하여 영적 간호 훈련 유무와 영적 간호 지식 교육 경험 유무에 따라 없을 때를 0, 있을 때를 1로 변환하여 분석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99로 잔차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공차한계는 0.64∼0.96으로 0.1 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04∼ 1.55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F=18.59, p<.001).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종교 중요도(β=0.24, p< .001),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습득 유무(β=0.22, p=.002),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β=0.24, p<.001)이었고, 설명력은 29.2%이었다.
-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이 영적 간호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영적 안녕의 하부 요인(종교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의 하부 요인(영적 간호 사정과 수행, 영적 간호의 질 향상과 전문화, 환자 상담과 개인적 지지, 전문가 의뢰,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74로 잔차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공차한계는 0.12∼0.61로 0.1 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65∼8.35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F=14.34, p<.001).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실존적 안녕(β=0.28, p<.001), 영적 간호 사정과 수행(β=0.23, p=.048),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β=-0.20, p=.035), 의사소통(β=0.38, p<.001)이었고, 설명력은 33.4%이었다.
- 영적 간호의 수행에 대한 모형의 설명력과 간명성을 높이기 위해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 종교 중요도, 영적 간호 지식 습득,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 실존적 안녕, 영적 간호 사정과 수행,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의 9개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종교와 영적 간호 지식 습득은 유무에 따라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의 가정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1.86으로 잔차의 독립성이 보장되었고, 공차한계는 0.36∼ 0.82로 0.1 이상이었다. 분산팽창지수는 1.22∼2.75로 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유의하였으며(F=17.50, p<.001),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종교 중요도(β=0.18, p=.013), 영적 간호 지식 습득 유무(β=0.14, p=.033),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β=0.21, p=.001), 실존적 안녕(β=0.18, p=.010), 의사소통(β=0.36, p<.001)이었고, 설명력은 41.1%이었다. 영적 간호 역량 중 의사소통이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 실존적 영적 안녕 순으로 높았다(Table 6).
결 과
- 본 연구에서는 간호 실무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 영적 간호 수행의 핵심 개념들의 특성과 관계를 동시에 탐색하고, 영적 간호 수행의 구체적인 영향 요인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간호사가 지각하는 방해 요인과 주관적인 느낌 등의 관련 정보는 영적 간호 실무의 실태를 보다 잘 이해하는 통찰력을 제공해주었다. 이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간호 실무 향상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86.9%가 환자의 임종을 경험한 간호사였으나 70.6%가 영적 간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41.6%가 영적 간호에 대한 지식 습득 경험이 없었다. 또한 72.4%가 암 환자를 돌보면서 영적 간호가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간호 유형이라고 했으며, 영적 간호 수행의 어려운 점으로 66.8%가 전문지식, 기술, 의사소통을 포함한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는데, 이는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간호사의 61.2%가 자신의 영적 간호 수행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했으며, 수행하지 못할 때 42.6%가 환자에게 미안함, 안타까움을 느꼈으며, 이외에도 상당수가 자책감, 무력감, 죄책감, 우울감, 답답함, 불편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이는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어려움, 영적 간호 수행 실태와 교육이나 훈련의 필요성을 잘 나타낸다.
-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실존적 안녕은 보통 수준, 종교적 안녕은 보통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다. Shin et al.(2004)과 Lim (2009) 연구와는 거의 같으며, Choi (2014) 연구나 영적 안녕을 실존적 안녕 도구만으로 측정한 Sim et al.(2017) 연구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는 관련 연구들에서 간호사의 실존적 안녕이 종교적 안녕보다 높은 수준이었던 결과와 같은 맥락이며,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도구의 차이로 보인다. 실존적 안녕은 삶의 의미와 만족, 미래지향적 신념 측면의 안녕상태로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미래에 대해 긍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느끼는 것이다(Paloutzion et al., 1982). 간호사의 존재 자체는 영적 간호 수행의 도구가 되므로 간호사가 영적 간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영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Choi, 2014). 따라서 간호사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미래에 대한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실존적 안녕 차원의 지원과 종교와 신의 의미를 숙고해 보는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 영적 돌봄 역량은 보통 수준이며, 하부 요인 중 의사소통,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의 순이었던 반면 영적 간호의 질 향상과 전문화가 가장 낮았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Lee (2016) 연구의 보통 수준, 하부 요인에서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 의사소통, 질 향상과 전문화의 수준과 매우 유사하다. 영적 돌봄 역량 중 의사소통은 환자의 영성에 민감성을 갖고, 잠재된 영적 요구를 확인하여 환자에게 관심, 공감, 격려, 동정, 진실성 등 수용적인 태도로 환자의 질병이나 장애와 관련된 삶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능력이다(van Leeuwen et al., 2009). 간호사의 높은 의사소통 능력은 환자에게 안정감을 주며, 치료적 관계 형성을 하여 영적 요구를 인식하고 지지를 가능하게 하므로 영적 간호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적인 자질이다(Sim et al., 2017). 그러나 의사소통과 태도 측면의 간호 역량은 다른 하부 역량에 비해 다양한 간호교육과정과 훈련, 임상 경험 등을 통해서도 향상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보통 이상 수준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반면 다른 하부 간호 역량은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Lee (2016)는 간호사들의 영적 돌봄 역량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제언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영적 간호 역량의 교육과 훈련은 이 요인들 각각에 보다 초점을 두어 특화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영적 간호 수행은 보통 이하의 가끔 하는 수준이며, 하부 요인 중 사랑과 관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 용서받고 싶은 요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 의미와 목적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 순으로 낮았다. 이는 본 연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Shin et al., 2004; Lim, 2009)의 수준과 유사하였으나 본 연구가 전체적으로 점수가 다소 높았다. 사랑과 관심에 대한 영적 간호 수행은 환자에게 간호 절차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환자를 돌봐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환자를 이해하며 이야기를 경청하고, 필요할 때에 환자의 곁에 있어 주며 가정과 비슷한 분위기의 안정감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Fish et al., 1983). 간호 수행이 가장 낮았던 의미와 목적의 하부 요인은 종교 메시지나 종교 음악 들려주기, 환자와 함께 기도하기, 영혼의 문제나 내세에 관해 이야기하기 등을 포함한다. 이는 영적 간호 수행에서 종교적인 행위는 간호사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영적 간호의 실제 수행에 작용했을 수 있다(Shin et al., 2004). 반면 본 연구에서 간호사가 종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영적 간호 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Yoon (2009)의 연구에서 신앙생활기간, 예배참여정도, 종교가 삶에 미치는 정도, 개인이 지각한 믿음 정도에 따라 영적 간호 수행이 차이가 있었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종교적 차원의 영적 간호 역량 부족으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 영적 간호 수행의 방해 요인은 업무 환경의 어려움과 교육 및 훈련 부족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시간 부족, 업무 과다, 영적 간호 지식 부족, 의사소통기술 부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Shin et al., 2004; Lim, 2009)에서 영적 간호 수행의 문제점을 시간 부족, 영적 간호 지식 부족, 신앙심 부족, 높은 업무 스트레스라고 한 것과 매우 유사한 결과이다. 즉 영적 간호 수행을 방해하는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와 함께 영적 돌봄 역량의 의사소통기술과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Choi 등(2019)도 영적 간호를 접하지 못한 간호사를 위해 단기 교육을 병원 차원에서 제공하거나,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에 영적 간호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운영할 것을 제언한 바 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영성 및 관련 특성을 고려한 영적간호교육 프로그램을 제언한 Lee et al.(2016)의 견해와 유사하며, 대학원에서도 학부과정과 연계된 보다 심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무 차원에서는 시간과 비용 등 조직적 차원의 우선적 지원으로 관련 직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간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안녕, 영적 돌봄 역량, 영적 간호 수행의 모든 개념 간에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영적 안녕과 영적 간호 수행 간의 Lim (2009)의 연구와 Choi (2014) 연구에서의 약한 상관 보다 높았으며, Sim 등(2017)의 연구와는 유사하였다. 이는 t-test와 ANOVA의 차이 검정으로 분석한 Lim (2009)의 연구에서 임종 경험 빈도, 영적 도움 의뢰 등 체험적 요인에 따라 영적 간호 수행 정도가 유의하게 큰 차이를 보인 결과들을 근거로, 연구 대상자 선정 조건의 차이로 인한 결과임을 유추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대상자가 암환자를 1년 이상 돌본 경험이 있는 간호사였던 반면 Lim (2009)과 Choi (2014)의 연구 대상자는 일반 간호사로서 실무에서의 영적 간호 요구나 민감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영적 간호 수행은 간호제공자인 간호사의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며, 하부 요인에서 의사소통, 실존적 안녕, 영적 간호 사정과 수행, 환자의 영성에 대한 태도 순으로 영향을 주었음이 확인되었다. 영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특히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을 검증한 선행 연구는 찾기 어려워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나 회귀분석으로 영적 돌봄 역량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Sim 등(2017)의 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달리 일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음에도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실존적 안녕, 영적간호제공 경험이 영적 돌봄 역량에 영향을 주었고, 이중 의사소통능력의 영향이 가장 컸다. 본 연구와 Sim 등(2017)의 연구를 통해 간호사의 영적 간호 영역에서 의사소통능력과 실존적 영적 안녕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으로 인구사회적 특성, 영적 관련 특성, 영적 안녕과 영적 돌봄 역량의 각 세부 요인들이 영적 간호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시한 회귀모형에서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의 영향 요인은 의사소통,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 종교 중요도, 실존적 안녕, 영적 간호 지식 습득이었다. 이들 영향 요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의사소통의 영적 돌봄 역량과 간호사의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 요인들과 정도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단계별 영적 간호 수행 증진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효과를 검증할 것을 제언한다. 특히 영적 간호 수행 만족도 등 각 영향 요인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 체험, 숙고 기회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적 간호 수행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이므로 추후 본 연구와 같이 암환자를 돌보는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보다 많은 반복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적 간호 수행의 실태에 기초하여 암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영적 간호 수행의 어려움과 이들의 정서 및 심리적 경험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고 찰
Table 1General characteristics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N=214)
Table 2Spiritual characteristics of nurses caring for cancer patients (N=214)
Table 3Correlations among the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care compe-tence, and spiritual nursing (N=214)
| Variables | SWB | SCC | SN | ||
|---|---|---|---|---|---|
|
|
|
|
|||
| r (p) | r (p) | r (p) | |||
| Spiritual well-being | 1 | ||||
| Spiritual care competence | .54 (<.001) | 1 | |||
| Spiritual nursing | .44 (<.001) | .48 (<.001) | 1 |
Table 4Influencing factors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spiritual nursing (N=214)
Table 5Influencing factors of spiritual related characteristics on spiritual nursing (N=214)
Table 6Influencing factors on spiritual nursing (N=214)
- 1. Choi GH. 2014;A study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spiritual well-being, perception of spiritual needs of patients and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 among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4):2245-2259. http://uci.or.kr/G704-000930.2014.16.4.013
- 2. Choi SK, Kim J, Kim SY. 2019;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spiritual care education program for nur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9(9):67-77. doi:10.22156/CS4SMB.2019.9.9.067
- 3. Chung MJ, Eun Y. 2011;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spiritual care education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4(5):673-683. doi:10.4040/jkan.2011.41.5.673.
- 4. Cooper KL, Chang E, Luck L, et al. 2020;How nurses understand spirituality and spiritual care: A critical synthesis. J Holistic Nurs. 38(1):114-121. doi:10.1177/0898010119882153.Article
- 5. Fish S, Shelly JA. 1978,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1st ed. InterVarsity Press; Illinois.
- 6. Fish S, Shelly JA. 1983,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2nd ed. InterVarsity Press; Illinois.
- 7. Fisher J, Brumley D. 2008;Nurses's and care's spiritual wellbeing in the workplace. Australia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4):49-57.
- 8. Garssen B, Visser A. 2016;The association between religion/spirituality and mental health in cancer. Cancer. 122(15):2440doi:10.1002/cncr.30020.ArticlePubMed
- 9. Highfield ME. 2000;Providing spiritual care to patients with cancer. Clin J Oncol Nurs. 4(3):115-120. http://www.riss.kr.libmeta.knou.ac.kr:8010/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c7904b7718402cbaffe0bdc3ef48d419 PubMed
- 10. Hu Y, Jiao M, Li F. 2019a;Effectiveness of spiritual care training to enhance spiritual health and spiritual care competency among oncology nurses. BMC Palliative Care. 18(1):1-8. doi:10.1186/s12904-019-0489-3.ArticlePubMed
- 11. Hu Y, van Leeuwen R, Li F. 2019b;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spiritual care competency scale in nursing practice: A methodological study. BMJ open. 9(10):doi:10.1136/bmjopen-2019-030497.Article
- 12. Jo HM, Jang YN, Choi HJ. 2019;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spiritual care in Korea: Focusing on the Christian perspective. Faith & Scholarship. 24(3):199-219. doi:10.30806/fs.24.3.201909.199.
- 13. Joo YS, Kim HS. 2020;Effects of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 on spiritual well-being and anxiety in elders with cancer. J Korean Gerontol Nurs. 22(2):95-104. doi:10.17079/jkgn.2020.22.2.95.Article
- 14. Kang SR. 2006;Concept analysis of spiritual care. J Korean Acad Nurs. 36(5):803-812. doi:10.4040/jkan.2006.36.5.803.Article
- 15. Kim CN, Song MO. 2004;Effect of spiritual nursing intervention on spiritual wellbeing and depression of hospice patients. J Korean Academy of Community Nurs. 15(1):132-144.
- 16. Kim J, Choi SK. 2015;Influence of self-esteem, empathy and existential well-being on spiritual care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22(3):238-337. doi:10.7739/jkafn.2015.22.3.328.Article
- 17. Lee DY, Park JK, Choi AS. 2016;Convergence factors of spirituality affecting on spiritual wellbe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5):59-68. doi:10.15207/JKCS.2016.7.5.059.Article
- 18. Lee HJ. 2016;Factors affecting clinical nurses' spiritual care competence.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Seoul: http://www.riss.kr.libmeta.knou.ac.kr:8010/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dcf2303ef5591302ffe0bdc3ef48d419 .
- 19. Lee WH. 2000;Total pain of patient with terminal cancer. Korean J Hosp Palliat Care. 3(2):60-73.
- 20. Lim SS. 2009;Study of spiritual well-being and the spiritual nursing care of nurs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1. Mehdipoorkorani L, Bahrami M, Mosavizade R. 2019;Impact of a spiritual care program on spiritual wellbeing of oncology nurses: A randomized clinical trial. Iran J Nurs Midwifery Res. 24(1):38-43. doi:10.4103/ijnmr.IJNMR_33_18.ArticlePubMedPMC
- 22. Paloutzian RF, Ellison CW. In: Peplau LA Perman D . 1982;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 the quality of life. Jorn Wiley. New York, 224-237. .
- 23. Pantuso T. 2015;Spiritual interventions for patients with cancer. Integr Med Alert. 18(7):79-81.
- 24. Ross LA. 1994;Spiritual aspects of nursing. J Adv Nurs. 19(3):439-447. doi:10.1111/j.1365-2648.1994.tb01105.xCitations:101.ArticlePubMed
- 25. Shin SJ, Choi MH. 2004;A study for the spiritual well-being and the spiritual nursing care of nurses.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8(1):15-26.
- 26. Sim MR, Kim J, Choi SK. 2017;Influence of self-esteem, communication and existential well-being on spiritual care competence in nurses. J Korean Acad Fundam Nurs. 24(4):286-295. doi:10.7739/jkafn.2017.24.4.286.Article
- 27. Statistics Korea. 2019 Cause of death statistics. [Internet] Retrieved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0
- 28. van Leeuwen R, Tiesinga LJ, Middel B, et al. 2009;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n instrument to assess nursing competencies in spiritual care. J Clin Nurs. 18(20):2857-2869. doi:10.1111/j.1365-2702.2008.02594.x.ArticlePubMed
- 29. Yoo SY. 2013;Analysis of research trends about spiritual care in Korea. Korean J Adult Nurs. 25(3):332-343. doi:10.7475/kjan.2013.25.3.332.Article
- 30. Yoon MO. 2009;The spiritual well-being and the spiritual nursing care of nurses for cancer patient. Korean J Hosp Palliat Care. 12(2):72-79. .Article
References
Figure & Data
References
Citations
Citations to this article as recorded by 

- Effect of Nursing Model Based on Rosenthal Effect on Self-Efficacy and Cognition of Life Meaning in Patients with Non-Small-Cell Lung Cancer
Linghua Mao, Huaqin Lu, Yangyang Lu, Weiguo Li
Emergency Medicine International.2022; 2022: 1. CrossRef
 PubReader
PubReader-
 Cite
Cite
- CITE
-
- Close
- Download Citation
- Close
 XML Download
XML Download